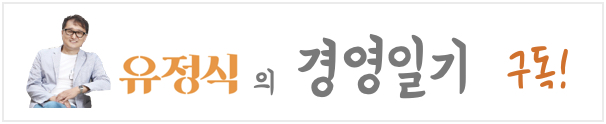우리는 많은 돈을 벌수록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지고 더 많은 시간을 여가 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 여유가 없고 시간에 쫓긴 듯 생활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시간에 쫓기며 생활하도록 만드는 원인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록 시간적 압박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샌포드 드보(Sanford E. DeVoe)와 스탠포드 대학의 제프리 페퍼(Jeffrey Pfeffer)가 이런 직관에 반하는 결론에 도달한 연구자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호주에서 2001년부터 이루어진 '가계 수입과 노동 간의 역학 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성별, 학력, 결혼 여부 등의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입의 크기와 시간적 압박감 사이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입이 높을수록 시간적 압박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통제된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드보와 페퍼는 학생들에게 가상의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하고서 '어떤 업무에 얼마의 시간을 투여했는지'를 기록하고 청구하는 과제를 맡겼습니다(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알 겁니다). 학생들 중 절반에겐 1분에 1.5달러를 받는 고임금의 직원으로, 나머지 절반에겐 1분에 0.5달러를 받는 저임금의 직원으로 인식시켰습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끝낸 후에 "나는 오늘 시간적 압박을 느낀다", "어제와 비교해 나는 오늘 시간에 대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다" 등의 질문에 7점 척도로 답해야 했죠. 그랬더니, 1.5달러 조건의 학생들이 0.5달러 조건의 학생들보다 시간적 압박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작위로 두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의 차이는 임금의 높고 낮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나는 가난하구나' 혹은 '나는 돈이 많은 편이구나'라는 상대적인 느낌도 시간적 압박과 관련이 있을까요? 드보와 페퍼는 학생들에게 11개의 보기를 주고 통장 잔고에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 중 절반은 범위가 0에서 500달러 이상까지 표시된 설문을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범위가 0에서 40만 달러 이상까지 표시된 설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전자는 학생들에게 '나는 돈이 많은 편이네'라고 느끼게 만들고, 후자는 '나는 돈이 별로 없구나'라고 느끼게 만들겠죠.
이렇게 조작한 상태에서 시간적 압박에 관한 질문을 던졌더니, 전자의 학생('부자라고 느끼는')들이 후자의 학생들보다 시간적 압박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토론토를 소개하는 소개 자료를 읽으라고 하니 '가난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에 비해 더 빨리 읽는 모습을 보였죠(64.7초 대 80.9초). 단순하게 시간적 압박을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시간에 쫓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보와 페퍼는 직장인들에게 연봉과 근무일을 물어 본 후에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도록 요청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 시간적 압박을 더 크게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시간의 경제적 가치'가 강조될수록(다르게 말해, '내가 한 시간에 얼마를 버는구나'를 인식할수록) 시간에 쫓기는 듯한 압박감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 시간에 쫓긴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 원인은 개인적인 능력, 과제 수행에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량, 각자의 근무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시사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불평하지만, 아귀아르(Aguiar)가 2007년에 출간한 논문에 의하면, 1965년부터 2003년까지의 데이터를 면밀하게 살펴보니 노동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에 쫓기듯 살고 있다는 느낌이 노동시간의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그보다는 드보와 페퍼의 연구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한 시간에 얼마를 벌까?'라는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주입 받기 때문이겠죠.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느끼는 사람들, 즉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시간적 압박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높은 임금이 경제적으로는 여유를 가져다 주겠지만 심리적인 여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말이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어쩌면 높은 연봉은 심리적인 여유라는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논문)
DeVoe, S. E., & Pfeffer, J. (2011). Time is tight: How higher economic value of time increases feelings of time press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6(4), 665.
Aguiar, M., & Hurst, E. (2007),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 969-1006.
'[경영] 컨텐츠 > 인사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금 보너스가 좋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0) | 2013.03.20 |
|---|---|
| 직원들 보너스, 돈으로 줄까 상품으로 줄까? (4) | 2013.03.12 |
| 오후 늦게 면접 보면 불리한 이유 (1) | 2013.02.25 |
| 다다익선이 목표 달성에 해가 될 수도 있다 (0) | 2013.02.22 |
| 긍정적 피드백이 독이 될 수 있다 (6) | 201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