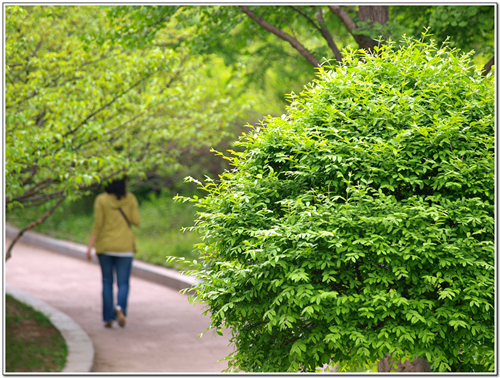"우리가 달에 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느냐구요? 그 질문은 무엇 때문에 높은 산에 오르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에너지와 기술을 조직화하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위성을 쏘아 올린 사건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이었다. 냉전 하에서 러시아에게 우주를 빼앗기는 것은 생존에 대한 절망이었기 때문이다.

경부운하, 호남운하, 충북운하... 우리나라를 운하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전은 케네디의 그것에 비해 어떠한가? 그의 말대로 임기 내에 경부운하가 완공된다고 해보자. 세계 만방에 "우리는 능력이 뛰어나서 5년 내에 거대한 운하를 팠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과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받게 될까?
대운하의 완공으로는 언감생심이다. 물류 분담률도 기대할 수 없고 관광용으로 하기엔 기대되는 수익도 보잘 것 없는 대운하를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의 정력은 그런데다 쓰는 게 아니다. 미래를 열고 미래를 밝히는 분야에 한푼이라도 보태야 할 이 때에 토건의 삽을 들이대며 '반짝 경기'를 기대하는 지도자를 보면서 통치자로서의 그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정말 두려운 나라야."라며 뭇 나라들의 경외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케네디처럼 야심차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정말 대운하 밖에는 아이디어가 없는가? 왜 그렇게 통치철학이 박약한 건가? 왜 개인적 고집으로 나라를 경영하려 하는가? 게다가 대운하에서 4대강 정비계획으로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이명박 대통령, 당신의 얄팍한 술수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는가?
후보자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존경하는 지도자로 UAE(아랍에미레이트)의 셰이크 무하마드 총리라고 답했다.(중앙일보 2007년 8월 6일) '개발지상론자'로서 서로 통한 모양인데, 4년 9개월의 남은 집권기간 동안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지 눈에 훤하다.
끝으로, 쉽지 않은 양심고백을 한 김이태 연구원의 용기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
(예전에 발행했던 글을 조금 바꿔 다시 발행합니다.)
'유정식의 서재 > [단상] 주저리 주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죽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0) | 2008.05.27 |
|---|---|
| 비가 내려야 무지개가 뜬다 (2) | 2008.05.26 |
| 김현식, 그가 그립다 (4) | 2008.05.21 |
| 악수 좀 세게 하지 마슈! (6) | 2008.05.16 |
| 미국이라는 깡패국가 (3) | 200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