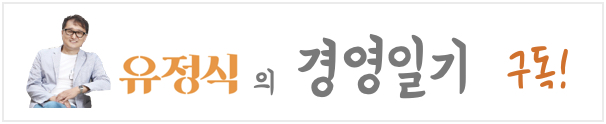우리는 토론할 때 참가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봅니다. 각자의 의견을 알아야 토론에 대비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회의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해보라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의견을 먼저 밝히는 과정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진짜로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회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엔 무엇이 있을까요?
스테판 슐츠-하르트(Stefan Schulz-Hardt)는 몇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 토론 전에 각자의 의견을 먼저 공유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4명의 항공기 조종사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하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후보에 대하여 ‘서니로 다른 일부분의 정보’만을 따로따로 제공했습니다. 연구자는 참가자들을 둘로 나눠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나는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도록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혼자만 알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두 그룹의 참가자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후보의 채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처음에 자신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든지 간에, 새로 받은 정보를 토대로 다시 결정해야 하겠죠. 하지만, 처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했던 참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최초에 내린 채용 결정이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결정을 고수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채용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반면에, 처음에 서로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던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회의의 90퍼센트 이상이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진행되는 회의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토론 전에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과정은 타인의 견해를 수용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음 결정을 고집하게 만들 뿐이죠. 그렇하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는 참가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각자의 의견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참조해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려면, 각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것은 말씀 드렸다시피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일란 야니프(Ilan Yaniv)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특정 음식의 이름을 보여주고, 칼로리가 얼마인지 맞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니프는 한 쪽 그룹의 참가자에게는 ‘당신과 짝지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칼로리가 얼마라고 예상할 것 같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칼로리 값을 쓰도록 했습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라고 했던 겁니다.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이런 질문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입장’의 참가자보다 ‘타인 입장’에서 판단한 참가자가 처음에 썼던 칼로리 값을 더 많이 수정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정확도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타인 입장’ 참가자가 ‘자기 입장’ 참가자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냈습니다. ‘자기 입장’ 참가자들은 평균 오차가 77.5였구요, ‘타인 입장’ 참가자들은 그 값이 62.8에 불과했죠. 간단한 실험이지만, 타인의 입장이 되어 판단하라, 이런 일반적인 조언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질문이 나쁜 판단을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회의 참석자의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각자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잘 알아도, 직급 낮은 부하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메튜 메이(Matthew E. May)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의 직원들과 워크숍을 하기 전에 ‘달에서 살아남기’란 게임을 했습니다. 이 게임에 이기려면, 달에서 조난 당한 우주 비행사라고 생각하고 15개 물품을 생존에 도움이 되는 순서로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메이는 10명씩 조별로 게임을 진행하게 했는데, 각 조에는 팀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여러 직급이 고루 섞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메이는 게임 시작 전에 각 조의 말단 사원만 따로 모아서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게임 막바지에 가서 조원들에게 ‘내가 답을 안다’, 이렇게 말하게 했죠. 게임 진행자가 정답을 미리 알려줬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15개조 모두 정답을 맞혔을까요? 애석하게도 정답을 맞힌 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말단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시켰기 때문입니다. “네까짓게 뭘 안다고?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라고 말하면서 입을 막아버렸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해도 회사 문화가 위계를 중시하고 있다면, 좋은 의사결정은 물건너 갑니다. 말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해도 실제로는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직원의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보다 더 좋아도 직원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권위가 꺾인다고 생각하는 관리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한번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휘둘릴 거라고 염려하기도 하죠. 물론 관리자가 자신의 의지를 밀고 가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권위를 앞세우기 전에 논리로 직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의견을 먼저 말하지 않게 하는 것, 판단을 할 때 타인의 관점을 일부러 취하는 것, 회의하는 자리에서 권위와 위계를 앞세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회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도서)
<착각하는 CEO>, 유정식 저, 알에이치코리아, 2013
'[경영] 컨텐츠 > 경영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직의 갈등은 유익하다 (0) | 2015.04.13 |
|---|---|
| 삼시세끼 어촌편이 경영에 주는 시사점 (1) | 2015.03.16 |
| 이케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4) | 2015.02.10 |
| 전략의 의미와 전략가의 역할 (0) | 2015.02.03 |
| 전국 10대 빵집을 순례하다 (4) | 2015.02.02 |







 ScenarioPlanner.pdf
ScenarioPlann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