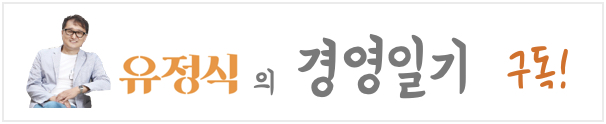페이스북이 온라인 교육사업에 뛰어 들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저께 페이스북은 '런 위드 페이스북(Learn with Facebook)'이란 사이트를 오픈하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100만 명의 사업주들을 교육사업의 고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learn.fb.com 입니다.
접속하면 아직까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업로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하고 심화해 가는지, 경력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모두 13개의 과목이 올라가 있죠. 한 과목은 4분에서 11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마음만 먹으면 1~2시간 만에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 'Learn with Facebook의 첫화면. http://learn.fb.com 에서 캡쳐)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SNS의 거대기업인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라서 프로그램의 양과 질은 점차 강화되리라 보여집니다. 페이스북의 정책 마케팅 책임자인 파티마 살리우(Fatima Saliu)는 '런 위드 페이스북' 사이트의 목표고객은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입문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런 위드 페이스북이 '경력 개발의 포털'이 되겠다는 것이죠.
런 위드 페이스북의 론칭은 링크드인이 자리잡고 있는 영역으로 페이스북이 깊숙이 진입한다는 강력한 도전장이기도 합니다. 링크드인도 2015년부터 '링크드인 러닝(LinkedIn Learning)'을 운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해부터 기업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 정보를 포스팅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멘토십(Mentorship) 도구를 개선하여 사용자들이 타 그룹 멤버들의 특정 경력과 전문영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전문가 서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도록 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사업들 모두 링크드인과 상당히 중복되는지라 두 거대 SNS 공룡기업 사이에 벌어질 앞으로의 싸움이 흥미진진하리라 예상되네요.
많은 사람들의 페이스북의 해가 저물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다른 SNS가 페이스북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월간 이용자수가 22억 7,1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사용자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거대한 사용자 베이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교육 사업까지 뛰어드 페이스북이 과연 '경력 개발 영역'의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는 페이스북에게 승산이 충분하다고 봅니다(적어도 북미 시장에서는). 플랫폼 규모 그 자체가 페이스북의 강한 경쟁력이니 말입니다.
'[연재] 시리즈 > 경영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등짝 스매싱 몇 대 맞고 취향을 살려라 (0) | 2022.09.13 |
|---|---|
| 5년의 시간을 치열하게 인내하는 법 (0) | 2022.03.15 |
|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효과 65조원은 과연 옳은가? (0) | 2018.01.22 |
| 양껏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과학적 방법 (0) | 2017.12.04 |
|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은 진짜 다른가? (0)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