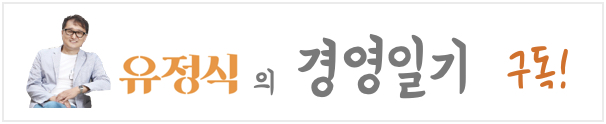아이디어를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은 브레인스토밍이란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브레인스토밍를 창시한 오스본(Osborn)의 말처럼, 주제에 집중하되 각자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도록 권장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손에 쥘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곤 하죠.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느꼈겠지만, 브레인스토밍으로는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고사하고 아이디어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여럿이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아이디어의 카테고리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문제, 아무리 비판을 가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도 '자기 검열'은 막을 수 없는 문제, 좌중을 압도하는 특정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오스본의 제시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을 지키기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이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정확하게 검증한 연구는 아주 많습니다. 특히 니콜라스 콘(Nicholas W. Kohn)과 스티븐 스미스(Steven M. Smith)는 AOL 인스턴스 메신저를 가지고 통제된 조건에서 실시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브레인스토밍이 아이디어의 '순응(Conformity)'과 '고정화(Fixation)'를 야기하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콘과 스미스는 160명의 참가자들을 메신저가 설치된 컴퓨터 앞에 앉히고 '텍사스 A&M 대학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칸막이가 쳐졌기에 참가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메신저를 통해 아이디어를 내야 했죠. 참가자들 중 절반은 혼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다음 그것을 오직 실험자에게만 전달했고, 나머지 절반은 같은 그룹의 멤버끼리 메신저의 채팅 기능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분 간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이 끝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혼자 아이디어를 생각한 참가자들이 채팅을 한 참가자들보다 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했습니다. 산출된 아이디어의 다양성도 더 컸죠. 하지만 두 그룹 사이에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디어의 심도(depth)는 반대로 채팅을 한 참가자들이 더 컸습니다. 이 결과는 처음부터 여럿이 브레인소토밍을 벌이는 것보다는 일단 각자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생각해 본 다음에 모이는 것이 아이디어의 양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채팅을 한 참가자들의 아이디어 심도가 높았다는 결과는 그들의 아이디어 다양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이디어들이 서로 비슷해지고 몇몇 카테고리로 집중되는 '고정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콘과 스미스는 브레인스토밍이 참가자들로 하여금 다른 이의 아이디어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그 때문에 아이디어의 고정화가 야기된다는 점을 후속실험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참가자들은 각자 2명씩 짝을 이루어 메신저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헌데 함께 브레인스토밍하기로 정해진 상대편 사람은 사실 연구자들에게 고용된 공모자였죠. 공모자는 참가자들을 4그룹으로 나눠 미리 정해진 아이디어를 각각 1개, 4개, 10개, 20개를 메신저로 보여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콘과 스미스는 공모자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개수가 참가자의 아이디어 창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우선, 공모자가 참가자에게 보여주는 아이디어 개수와 상관없이 참가자가 내놓는 아이디어의 양과 다양성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자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 본 참가자일수록 공모자의 아이디어에 순응한다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공모자에게서 오직 1개의 아이디어만 전달 받은 참가자들이 아이디어의 참신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들은 20개의 아이디어를 받아 본 참가자들에 비해 참신성 점수가 92%나 높았습니다. 이는 여럿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이 쌓여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브레인스토밍의 특성 상, 참석자들이 다른 참석자의 의견에 순응하고 동조될 수밖에 없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어려움을 바로 드러냅니다.
많은 조직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일상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을 뿐 그룹 토론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의 결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겁니다. 콘과 스미스는 세 번째 실험을 통해서 '휴식'이 해독제임을 규명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상대방으로 정해진 공모자로 하여금 참가자에게 세션이 시작되고 나서 10초, 3분, 6분, 9분 시점에 하나씩의 아이디어를 메신저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을 절반으로 나눠 첫 번째 그룹에게는 5분 정도 미로 찾기 게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브레인스토밍의 두 번째 세션을 10분 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런 휴식 없이 20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했죠.
결과를 분석하니, 중간에 미로 찾기 게임을 한 참가자들이 그렇지 못한 참가자들에 비해 40퍼센트나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아이디어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우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면 계속 이어서 하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기대와 달리 아이디어의 양과 질적인 측면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각자가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중간에 '한 두 번 끊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순응하고 고정화되는 경향을 줄임으로써 아이디어의 양과 질을 제고할 수 있죠. 또한, 아이디어의 심도를 높인다는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이 특정 주제에 관한 한 아이디어를 깊게 파고드는 데에 적당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폭넓게 논의하자는 의도로 브레인스토밍을 실행해봤자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파고들 때야 브레인스토밍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은 크고 작은 브레인스토밍을 했거나 할 예정일 겁니다. 주제가 무엇이든 브레인스토밍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면 브레인스토밍의 문제를 중화할 수 있는 해독장치(휴식, 브레인라이팅 등)를 써보면 어떨까요?
(*참고논문)
Nicholas W. Kohn, Steven M. Smith(2010), Collaborative Fixation: Effects of Others’ Ideas on Brainstorming, Applied Cognitive Psycology, Vol.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