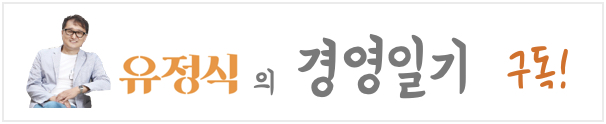여러분의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 매출이 급증했다거나 특허를 획득했다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상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사는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반대로 매출이 급락했다거나 고객으로부터 클래임을 받았다는 것처럼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보고 내용에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상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각한 표정을 지며 우울해 하거나 이런 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겠죠.
헌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식의 보고 내용이라면 상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제품이 출시됐는데 시장의 첫 반응을 살펴보니 대박을 터뜨릴지 머지않아 시장에서 퇴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들은 후 상사의 기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상사의 반응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제이콥 허쉬(Jacob B. Hirsh)와 마이클 인즈리히트(Michael Inzlicht)는 "불확실하다"는 정보를 접하고 나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크기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뇌파 검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허쉬와 인즈리히트는 41명의 실험참가자들을 모집하여 먼저 다섯 가지 요소로 성격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각자의 머리에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 모자를 씌우고 컴퓨터 모니터 상에 표시가 나온 후 1초가 흘렀다고 짐작될 때 키보드를 누르도록 했습니다. 참가자가 비교적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히면 화면에 플러스(+) 표시가, 1초에서 벗어나면 마이너스(-) 표시가, 그리고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물음표(?)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참가자가 키보드를 정확한 타이밍에 누르든 그렇지 않든 세 가지 표시는 총 168회를 실시하는 동안 거의 같은 빈도로 나오도록 조치했죠.
실험이 끝난 후, 허쉬와 인즈리히트는 참가자들의 '신경질적인 정도'와 '부정적인 뇌파 반응'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피드백(화면에 마이너스 표시)을 받으면 신경증적인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로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를 들을 때 거의 모든 상사가 비슷한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불확실한 피드백(화면에 물음표 표시)을 받을 때 참가자 각자의 신경질적인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 반응의 강도가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신경질적인 정도가 낮은 참가자, 다시 말해 흔히 신경이 무딘 사람들은 불확실한 피드백을 받을 때는 그다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경질적인 사람들(신경질적인 정도가 높은 참가자)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보다 불확실한 피드백을 받을 때 훨씬 강한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식의 불확실한 보고를 받으면 "제품 매출이 떨어진다"란 부정적인 보고를 받을 때보다 머리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허쉬와 인즈리히트의 연구는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노출되면 부정적인 정보를 접할 때보다 더 불편해 하고, 신경이 무딘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를 봐도 부정적인 감정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상사의 성격(신경질적인 정도)에 따라 불확실성을 못 참기도 하고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일 상사가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다면 불확실성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든 미래를 '예측해 내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 내릴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런 류의 경영자들에게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전략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시나리오 플래닝'이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경험상 까칠하고 꼼꼼하고 예민하고 다혈질적인 경영자들은 시나리오 플래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령 시나리오적으로 미래를 그린다 해도 '가장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판단하고자 하겠죠(시나리오 플래닝으로 나온 각 시나리오는 발생 가능성이 동일하다고 간주해야 함). 시나리오 플래닝을 그저 비상경영을 대신하는 멋진 문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아직 이것은 불확실하다'라고 보고할 때 상사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사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탓입니다. 여러분의 상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고논문)
Jacob B. Hirsh, Michael Inzlicht(2008), The Devil You Know Neuroticism Predicts Neural Response to Uncertainty, Psychological Science, Vol. 19(10)
'[경영] 컨텐츠 > 시나리오 플래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태'를 시나리오 플래닝하면? (0) | 2014.12.10 |
|---|---|
| '허니버터칩을 증산할까'를 시나리오 플래닝으로 풀면... (0) | 2014.12.09 |
| 회색빛 미래보다 장미빛 미래에 끌리는 이유 (4) | 2012.05.14 |
| '이 산이 아닌가벼'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 (0) | 2012.02.17 |
| 소니의 전략은 정말 멍청했나? (3) | 201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