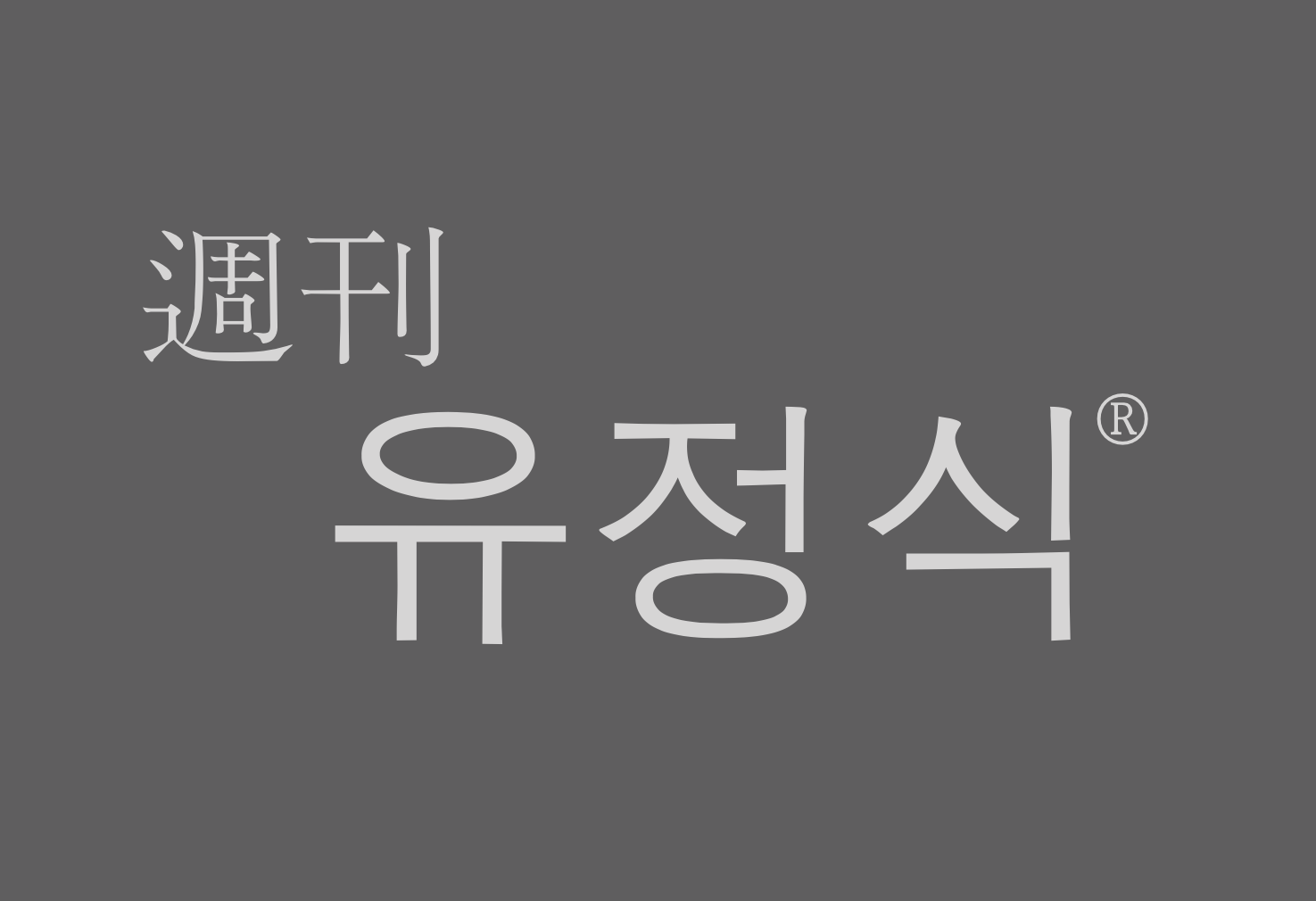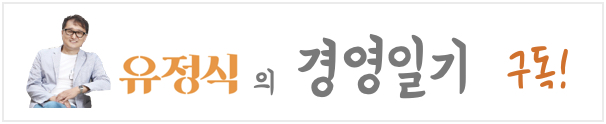'주간 유정식'의 창간 준비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주간 유정식'의 창간준비호가 오늘 발행됐습니다.
창간준비호는 정기구독 신청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주간 유정식'의 잡지 구성이나 디자인, 컨텐츠 주제 등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잡지는 매주 1편씩 발행되는 주간지로서, 조직경영, 리더십, 인사, 조직문화 등에 관한 경영에세이와, 해외 유명 경영 사이트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중에 좋은 글을 요약 소개하는 란과, 소소한 일상에서 경험한 경영의 시사점을 풀어보는 경영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창간준비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창간준비호 다운로드 받기

창간호(1호)는 정기구독자 모집 기간을 거쳐 4월 21일(화)에 첫 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정기구독 신청을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 양식을 제출하시고,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syu@infuture.co.kr
휴대폰: 010-8998-8868 (유정식)
아래의 글을 창간준비호에 첫머리에 게시된 '창간을 준비하며...'란 글입니다. 여기에 공유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면 교육을 하지 못하니 수입 감소로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저는 번역을 병행하기에 조금은 나은 편이나, 2~3월에 계획된 모든 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매출에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라고 조언합니다. 의미있는 조언이지만,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렉션과 디스커션에 제약이 많아서 저의 '소규모 교육' 방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근본적인 타개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권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닐 뿐더러 불특정다수를 대해야 한다는 부담도 크더군요.
이 참에 새로운 컨텐츠를 축적하고 R&D에 매진하는 것이 멀리 보고 길게 가는 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하고 이런 저런 궁리를 하던 차에 마침내<주간 유정식>을 창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런 구상은 2년 전부터 해오던 차였습니다. 몇 해 전 어떤 이의 표절 사건으로 인해 공개된 곳에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글을 좋아하며 소통하기를 원하는 분들께 재미있고 유용한 컨텐츠를 ‘exclusive’하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때 <주간 유정식>이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이죠.
<주간 유정식>의 창간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잡지 유통은 무단 배포의 위험이 있다, 회원가입 모듈과 전자결제 시스템이 갖춰진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여러 가지 구독료 옵션을 둬야 한다, 등이었죠. 컨텐츠에 대해서는 시의성이 있어야 한다, 재미난 요소가 많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디지털 컨텐츠를 조회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할 생각이지만, 1 호부터 50호까지 발행될 <주간 유정식>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정기구독한 만화잡지가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올 때처럼, 매주 화요일 오전에 받은메일함에 도착한 <주간 유정식>이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거든요. 게다가 컨텐츠 창출, 디자인, 홍보, 딜리버리, 구독료 수납 등을 모두 저 혼자 해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촌스럽지만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이메일 배포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컨텐츠의 방향은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발상을 전환하는 쪽이 그간 제가 생산해 오던 컨텐츠의 방향이었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간 유정식>의 컨텐츠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좀 우스운 비유일지 모르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 저는 "가장 '유정식'스러운 것이 가장 대중적인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주간 유정식>이라는 제호를 보고 ‘주간 경영 뉴스’를 연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본 잡지는 그런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 잡지와 경제 일간지는 이미 많으니까요. <주간 유정식>은 독자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한 번씩 만나 컨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입니다. 향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독자 투고도 받으면서 인터렉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다소 부담스러시겠지만 1년 정기구독만을 받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1년간 함께 만나는 ‘가상 동아리’가 되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창간호 발간은 4월 21일로 계획 중입니다. 본 창간준비호를 통해 잡지의 외양과 컨텐츠 방향 등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창간준비호에도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방법, 구독료 등이 소개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1년 동안 창간호부터 50호까지 <주간 유정식>을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1년에 50호의 주간지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인 게 사실입니다. 낙장불입이란 이런 걸까요? 많은 분들과 약속했고 저 자신과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으니 이제 무를 수 없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늘 투자하시는 분들, 지식노동자로서 제2의 경력을 꿈꾸시는 분들, 조직경영의 방향과 방법을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의 목표 독자입니다. <주간 유정식>은 미약하나마 그 분들께 미약하나마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주간 유정식>의 독자가 되어주실 분들을 기다리며 창간호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퓨처컨설팅 > [새소식] what's n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간 유정식, 시즌 1을 종료하며... (0) | 2021.04.21 |
|---|---|
| 고대하던 '주간 유정식'의 창간호가 발행됐습니다! (1) | 2020.04.21 |
| '주간 유정식'을 창간합니다! (0) | 2020.03.19 |
| 2020년 1분기 튜터링 일정을 공유합니다 (0) | 2020.01.02 |
| '자발적 원고료'로 블로그를 응원해 주세요 (0) | 2018.11.22 |